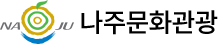(65) 나대용, 1607년 초에 조선차관(造船差官)으로 근무하다.
- 작성일
- 2022.11.17 13:50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68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65회 나대용, 1607년 초에 조선차관(造船差官)으로 근무하다.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1600년 9월에 경상도 고성현령으로 부임한 나대용은 근무한지 1년 2개월이 지날 무렵인 1601년 11월에 나대용은 모친상을 당했다. 그는 나주에서 3년상을 치렀다. 그런데 연거푸 부친상을 입었다. 1606년 11월이 되어서야 나대용은 거상(居喪)을 마칠 수 있었다.
나대용이 모친상을 치르고 있을 때인 1605년 4월에 조정은 선무원종공신 9,060인을 선정하였다. 선무원종 일등공신 561명 중 수군 장수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나대용의 무과 동기인 김응함·김축·송희립·신여량·위대기·이섬 등도 선무원종일등공신으로 책훈되었다. 하지만 나대용은 선무원종공신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제장명, 나대용의 임란시기 활동과 역사적 의미, 2022.11)
1606년 12월 10일에 나대용은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사우도수군절도사 이운룡(李雲龍, 1562~1610)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1) 이운룡은 나대용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1606년 12월 24일에 치계하였다. 1606년 12월 24일의 선조실록을 읽어보자.
“겸 삼도통제사(兼三道統制使) 이운룡이 치계하였다.
"나주에 사는 전 현령 나대용의 상소 내용에, ‘신은 나주에서 성장하였다. 계미년(1583년)에 등과(登科)하여 6년 동안은 북쪽을 방어하였고 2) 7년 동안은 남쪽을 방수(防戌)하였으며, 신묘년(1591년) 연간에는 수사(水使) 이순신의 감조전선출납군병군관(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이 되었다. 임진 왜변의 초기에 옥포에 머물고 있던 왜적이 진격해와 싸움을 벌일 때 신은 발포 가장(鉢浦假將)으로서 앞장서 돌격해 들어가 적선 2척을 포획하였고, 사천·선창(船滄)·당항포 등지의 15여 회에 달하는 전투에서는 모두 수공(首功)을 세웠으므로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강진 현감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로 연이어 금구·능성·고성의 현령에 제수되었다. 나 자신은 군대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군병(軍兵)의 기밀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되었다.
신축년(1601년) 11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돌아갔다가 연이어 부친상을 당해 6년 동안 거상(居喪)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복(服)을 마쳤기에 한 가지 계책이 있어 구중궁궐에 찾아와 호소한다.
대체로 왜적을 막는 데에는 주사(舟師 수군)보다 앞설 것이 없다. 임진(1592)·계사(1593)년간의 전선(戰船) 숫자는 거의 2백여 척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다. 그런데 정유재란(1597년) 뒤에는 간신히 마련한 전선의 숫자가 삼도(三道)를 통틀어 60여 척이었으니 각처에 배분하는 데 있어 극히 소홀하여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뉘라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마는 군사가 부족하여 만들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로써 배를 늘리는 계책을 말해보겠다. 거북선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숫자가 판옥선의 1백 25명보다 적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 씩만을 배치하고 더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기해년(1599년)간에 순찰사 한효순의 군관(軍官)이 되어 별도로 전선(戰船) 25척을 감조(監造)하였을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빽빽이 꽂았으므로 이름을 창선이라 하였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활쏘기의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다. 그뒤로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한 번도 전쟁에 쓰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버려두어 썩어가고 있다.
이후로는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람들이 실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어 만들지 않았고 그 제도마저도 그대로 버려둔 상태이다.
만일 다시 이 배를 만들도록 하여 대소(大小)의 여러 장수에게 각기 1척씩 맡긴다면 배 숫자는 전보다 배나 되지만 사수와 격군은 더 늘지 않아도 저절로 충분할 것이다. 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는 배의 사수·격군의 전 숫자를 창선에 옮겨 싣고, 각 고을의 배는 그 고을 수령의 수하군(手下軍) 및 하번(下番) 군사가 강어귀에 정돈하여 변란에 대비하다가 변란 소식이 들리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에게 조방장(助防將)이란 호칭을 띠고 미리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대용의 상소에 대해 비변사가 계목하였다.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를 받음)를 점련(粘連 보고나 제의 따위를 할 때에 문건의 끝에다 관련 서류를 덧붙임) 수군의 숫자는 상소에 말한 바와 같이 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정유년(1597년)에 패몰 당한 뒤로 빈 배가 있어도 사수와 격군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선의 제도를 상소에서 아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수전(水戰)에 유용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편리한 것으로 실제로 예사롭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시험해 보지 않았으니 쓸 만한가의 여부를 통제사에게 물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 창선이 쓸 만한가 여부를 속히 계문(啓聞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룀)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자 이운룡이 계문하였다.
“신이 임진년(1592년) 이후로 수전(水戰)에 종사하여 전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묘하게 강구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창선의 제도는 일찍이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격군 42명으로 바다를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선체가 협소하여 좌우에 방판(防板)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방판을 제거하면 화살과 돌을 막을 수 없어 전투에 임해 손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임진·정유·무술년의 싸움에서는 모두 판옥선처럼 큰 배에 힘입어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은 이미 보아온 증거입니다. 신은 감히 그렇게 이용하기가 묘한 점을 생각해내어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대용을 조선차관(造船差官)으로 호칭하여 한두 척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여 편리한 지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 하였다. 2)
이러자 다시 비변사가 선조에게 계하하였다.
"계하(啓下)를 점련합니다. 창선에 대한 제도는 통제사가 일찍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 하니, 장계에 언급된 대로 나대용을 속히 내려보내 감독해 만들게 하여서 쓸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이운룡의 상소에 따라 조정은 이운룡으로 하여금 창선을 1-2척 건조하여 시험해 보게 하였다. 이에 나대용은 ‘조선차관’으로 임명되어 통제영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선이 활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1607년은 일본과 화해 무드가 무르익어서 조정은 포로 쇄환을 위한 ‘회답겸쇄환사 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파견했다. 3)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전후 처리와 일본에 끌려간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 포로들을 ‘빗자루로 쓸듯이 모두 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였다.
1607년 2월 27일에 회답겸쇄환사가 부산을 출발하였다. 정사는 여우길, 부사는 경섬이며 총인원은 504명이었다. 사신은 국서를 전달한 후에는 오로지 쇄환에 주력하였다. 애도 막부는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각지에 쇄환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막부의 쇄환 명령은 지방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토에서 조차 막부의 명령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막부의 실력자 혼다 마사노부는 예조에 보내는 서계에서 “피로인들은 일본에 온지 거의 20여년이 되었다. 그 중 결혼하거나 자녀를 가진 자 들도 있다. 귀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본인이 원하면 귀국시키라는 것이 장군의 엄명”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원하면 귀국시키라’는 단서가 붙었으니, 이국땅에서 속박을 받던 포로들이 자유롭게 귀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본인이 원해도 주인이 놓아주지 않아 도망쳐온 예도 있었다.
이리하여 6월26일에 사신과 함께 쇄환된 사람은 겨우 1,418명이었다. 경섬은 ‘해사록’에 구우일모(九牛一毛)라고 적었다.
그런데 나대용이 조선차관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였을까. 선조는 1607년에 나대용을 곤양군수(昆陽郡守, 종4품)로 임명하였다.
주1) 이운룡(1562~1610)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옥포만호로 원균의 휘하에 있었는데 원균이 전선을 버리고 도망가려 하자 율포만호 이영남과 함께 항의하며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1604년에 선무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주2) 통제사 이운룡은 창선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병륜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김병륜, 나대용과 임진왜란기의 거북선, 2022.11.)
주3) 1604년에 조선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의중을 살피기 위하여 승려 유정(사명당)을 탐적사(探賊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했다.
1605년 3월에 송운대사 유정은 교토 후시미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다. 이때 이에야스는 “나는 임진년 당시에 관동에 있었고, 군사를 일으키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조선과 나 사이에는 원한이 없다. 화친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승려 유정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뜻을 확인하고 포로 1,39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