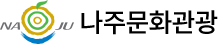(63) 격군도 못 구한 조선 조정
- 작성일
- 2022.11.15 14:18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98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63회 격군도 못 구한 조선 조정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1600년 1월 29일에 선조는 이항복·이산해등과 남방 방비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의 논의를 살펴보자.1)
선조 : "능숙한 의원을 데리고 가라. 외사(外司)에 약(藥)이 없으면 내약(內藥)을 가지고 가라. 전라도로 먼저 가겠는가?"
이항복: "먼저 호남으로 갔다가 보리가 익은 다음 영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식(聲息)이 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책응(策應)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豫定)할 수는 없습니다."
상 : "경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남방의 방비에 대한 제반 일을 얼마나 조치했다고 하던가?"
이항복 : "조정에서 바다를 방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있는데 전선(戰船)은 3도(道)를 합쳐 모두 80여 척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조 : "80여 척이 모두 판옥선(板屋船)인가?"
이항복: "판옥선입니다. 소선(小船)은 정수(定數)가 없기 때문에 판옥선만 말하였습니다."
선조 : "전선 하나마다 소속되는 소선의 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항복 : "판옥선은 아무리 작아도 속선(屬船)이 2척은 있어야 되는데 1척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육군을 조발하여 벌목(伐木)하느라고 많은 공역(功役)을 허비하였습니다."
선조 : "선재(船材)는 바닷가의 모든 섬에 무한히 있는가?"
이항복 : "선재는 이제 머지 않아 죄다 없어질 형편입니다."
선조 :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
선조 : " (판옥선) 80척에 격군(格軍)의 숫자가 다 충원되었는가?"
이항복 : "백성들이 정착하여 사는 집이 없어서 짐을 싸놓고 앉아 있는데 이들을 격군으로 삼았기 때문에 임진년 이후 전라도 연해에 사는 백성의 원고(怨苦)가 제일 극심합니다. 그래서 격군이 되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변사에서는 3번으로 나누어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전라도 순찰사 한효순이 사사로이 보내온 통문(通文)을 보니 초운(初運)은 교체시킬 수 있어도 2∼3운(運)으로 갈수록 점점 교체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
이산해 : "격군이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동(聳動)시키는 일을 거행해야 하는데 춘신(春汛)이 이미 박두하여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항복 : "더욱 극심한 것은 격군입니다. 사부(射夫) 포수(砲手)에 있어서도 일체 수군에 편입시켜 집을 돌아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연해의 무사들이 모두 서울로 도피하였다고 합니다."
선조 : "격군뿐만이 아니라 군량 등에 대한 일도 조판(措辦)했는가?"
이항복 : “화포(火砲)가 제일 필요한데 주조(鑄造)하여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중략)
이산해: "적이 대거 침입하여 오면 막기가 어렵겠지만 대마도의 노략질하는 왜적이라면 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장수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이항복 : "군함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패(大敗)한 뒤라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심이 임진년 때만 못한 것인데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략)
선조 : "방어하는 일 때문에 가는가, 조정의 명 때문에 가는가, 무슨 일로 가는가? 그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폐단이 있게 되어 백성들이 지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항복 : "남방뿐 아니라 온 나라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적이 육지에 상륙하면 방어하기가 바다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군은 말을 타야 싸울 수 있고 보병으로는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판출할 국력이 없습니다. 목장의 말들은 모두 모축(耗縮)되어 한 목장에 50∼60필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
(...)
선조 : "경도(鯨島)는 어디에 있는가?"
이항복 : "순천(順天) 앞바다에서 멀지 않습니다."
선조 : "적이 우리나라의 포작(鮑作)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해로의 형세에 대해 허실을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먼저 충청도를 침범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항복 : "적은 필시 전라도를 먼저 침범할 것입니다."
(...)
이어서 이항복이 아뢰었다.
"근일 전라도가 제일 걱정됩니다."
이산해 : "모질게 하면 적이 되는 것이고, 보살펴주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조 : "하서할 적에 내용을 잘 만들라."
이항복 : "출신(出身)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선조 : "어디 출신을 말하는가?"
이항복 : "호남 출신은 정유년(1597년)에 가업(家業)을 잃은 사람이 많은데 전주(全州)가 더욱 극심합니다. 그들은 모두 연소하고 활을 잘 쏘는데, 끝내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자 점차 위언(危言)을 퍼뜨리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선조 :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계책이 있다.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쓸 만한 사람이 있거든 직(職)을 제수하라."
(후략)” (선조실록 1600년 1월 29일 1번째 기사)
한편 2월 25일에 체찰사(體察使) 이항복이 연해 지역을 순찰한 후 수군·진상·공물 문제와 수령들의 실적에 대해서 아뢰었다.
"신이 연해의 여러 고을을 순찰하였습니다. 한산(韓山)에서 전라도의 지경으로 들어가니 수군에 소속된 각 고을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모두들 ‘당초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기를 「수군에 소속된 고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 」고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각자 기뻐하면서 「수군의 역(役)이 매우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사세로 헤아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믿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수군의 역 이외의 다른 고역(苦役)은 일체 감면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에 나아가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안정되어 방해(防海)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수군이 격군(格軍)을 정제하여 바다로 나간 지가 이미 한 철이 넘었는데도 실지로 여러 조항의 고역을 하나도 감경시켜준 것이 없다. 똑같이 한 나라의 백성인데 연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유독 수군의 고역을 받고 있다.’ 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원민(怨民)들의 실정이요, 비통한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사를 두루 물어서 만에 하나라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만, 전해 오는 구규(舊規)가 그러하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저 문부(文簿)를 조사하면서 탄식만 할 뿐 감히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좀 변통시켜도 될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청어(靑魚)의 진상과 각사(各司)의 긴요하지 않은 공물(貢物)과 조운선(漕運船)이 파선되었을 경우 연해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감경하고 징수하지 말 것을 아울러 시행하소서. (후략)”(선조실록 1660년 2월 25일)
이것이 이항복이 살펴 본 수군 고을 백성들의 원망이었다.
4월 4일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김억추가 장계를 올렸다.
"본도 순찰사 한효순의 품의에 대한 조정의 분부에 의거하여 신(臣)이 전선(戰船) 11척을 거느리고 고금도를 지키는 동시에 부근을 통망(通望)하기에 마땅한 선산도·완도·지도·조약도 등처에서 날마다 조망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본도의 수군이란 수군은 모두 영남으로 달려가서 힘을 합하여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이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충동격서(衝東擊西)의 환란이 없지 않으므로 각도의 수군들이 나누어 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에게 소속된 각 고을 나루터의 수군은 모두 좌도의 경도(鯨島 여수 소재)에 예속되었으며, 그 나머지 11척만이 나누어 머물고 있는데 거느린 여러 장수들과 약속하여 항상 토벌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변란이 생긴다면 외롭고 미약한 수군으로는 이에 대응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에서 가장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현자 총통인데 각 전선에 분배된 숫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신이 가까스로 주조해서 만든 것이 겨우 30여 병(柄)인데 역시 부족합니다. 넉넉하게 주조하려 해도 공사전(公私錢)이 모두 고갈되었으므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조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처하소서."
(선조실록 1600년 4월 4일)
이런 상황을 살피건대, 나대용이 격군 100명인 판옥선의 절반 밖에 안 된, 격군 42명의 창선을 만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나대용의 공로가 조정에서 받았들였을까? 1600년 9월에 나대용은 고성현령(固城縣令)으로 부임하였다. 고성현령은 종3품 통훈대부였다.
주 1) 당시 나대용은 전라도 순찰사 한효순의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