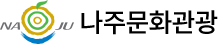(11) 전라 좌수사 이순신, 전란(戰亂)에 대비하다(2)
- 작성일
- 2022.08.02 18:15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67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11회 전라 좌수사 이순신, 전란(戰亂)에 대비하다.(2)
김세곤 지음 (호남역사연구원장,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순신의 전란 대비 사항을 계속하여 살펴보자.
5. 관내 순시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5관 5포의 전쟁 준비 상태를 점검하였다. '난중일기'에는 1592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5포를 순시한 기록이 나온다. 부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순시는 각 진의 전선과 군기 등의 준비태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19일 여도진 점검 - 20일 흥양현 도착 - 21일 흥양에서 회식 -22일 녹도진 점검 - 23일 발포진 점검 - 24일 사도진 도착 - 25일 사도진 점검 후 책임자 처벌 - 26일 방답진 점검 - 27일 좌수영 본영으로 귀환
그러면 순시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2월 19일
이순신은 순시를 떠나 백야곶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감목관(監牧官, 목장일을 담당하는 종6품 관리)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순천부사 권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권준은 이순신이 1589년 봄부터 전라감사 이광의 조방장을 하던 때에 알던 사이였다. 한번은 조방장 이순신이 순천에서 순천부사 권준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권준이 이순신에게 “이 고을이 아주 좋은데,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한번 맡아서 다스리지 않겠냐”고 하였다. 자못 자랑스러하면서 거만한 빛을 보였지만 이순신은 그냥 웃고 말았다. )
날이 저물어서 이목구미(여수시 화양면 이목리)로 와서 배를 탔다. 여도진(고흥군 점암면 여호리)에는 흥양현감 배흥립과 여도권관 황옥천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흥양현감은 내일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먼저 갔다.
2월 20일
아침에 여도진의 방비 실태와 전선(戰船)을 점검했다. 전선은 모두 새로 만들어 양호했고, 무기도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었다. 오후 늦게 흥양현(고흥군)에 이르렀다.
2월 21일
훙양 관아에서 공무를 마친 뒤에 흥양 현감 배흥립이 자리를 베풀고 활쏘기를 하였다. 조방장 정걸(고흥 출신 정걸은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노장이다)도 와서 인사를 하였고 능성현감 황숙도도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취하였다. 수고한 하인들에게도 술을 나누어 먹이도록 하였다.
2월 22일
아침에 일을 마친 후 녹도진(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으로 갔다. 녹도로 향하는 길에 흥양 선소에 들러 배와 군기들을 점검했다. 녹도 만호 정운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흥양현감·능성현감·녹도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대포 쏘는 것도 지켜 보았다.
2월 23일
늦게 발포(고흥군 도화면 내발리)로 출발했다. (이순신은 1580년 7월부터 1582년 1월까지 발포만호로 근무했다.) 역풍이 불어 간신히 성 머리에 배를 대었다.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가는데 비가 쏟아져 모두 흠뻑 젖었다. 발포진에 들어서니 이미 해가 저물었다.
2월 24일
비를 무릅쓰고 출발하여 사도진(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오후 늦게 도착했다. 흥양현감이 와 있었다. 배를 점검하고 나니 해가 저물어 하룻밤을 지냈다.
2월 25일
사도진 점검 결과 전비 태세가 결함이 많았다. 군관과 책임을 맡은 아전들을 처벌하였다. 첨사(김완)는 잡아들이고 교수(종6품의 유학 교관)는 내보냈다. 방비가 다섯 진포 가운데에서 가장 못한데도 순찰사가 잘 되었다고 장계를 올렸다니. 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니 쓴웃음이 나왔다. 역풍이 세게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어 또 하룻밤을 머물렀다.
(사도첨사 김완은 이순신에게 혼쭐이 났다. 그래서 그런지 김완은 전투에서 항상 선봉에 섰다.)
2월 26일
아침 일찍 배를 띄워 개이도(여수시 화정면 개도)에 이르니 여도의 배와 방답의 배가 마중 나와서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진(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도착했다. 무기를 점검한 결과 장전(長箭)과 편전(片箭)1) 가운데 어느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 참으로 걱정스러웠다. 다행히도 전선은 양호하였다.
2월 27일
아침 점검을 마친 후에 북쪽 봉우리에 올라 지형을 살펴보니, 외딴 섬에 자리잡은 방답진은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고, 성과 해자도 몹시 엉성하여 걱정스러웠다. 갓 부임한 첨사가 애는 썼으나 미처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것인가?
느지막이 배를 타고 경도(여수시 경호동)에 이르니 아우 이우신, 조이립과 군관, 우후들이 술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함께 즐기다가 해가 저문 뒤에야 본영으로 돌아왔다.
이 순회 점검은 부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전선과 무기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6. 방어시설 설치
가. 성(城)과 해자 (垓字 파놓은 못), 봉수대 등의 설치 정비
이순신은 침략에 대비하여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했다. 해자, 바다에 철쇄 등이 그것이다. 이울러 종고산과 돌산도 봉수대도 수리했다.
이를 ‘난중일기’를 통해 살펴보자.
1592년 1월 11일
서문 밖에 방비를 위하여 해자 (垓字 파놓은 못)가 네 발(양팔을 펴서 벌린 길이)쯤 무너졌다.
2월 4일
동헌에 나가 일을 마친 뒤 북쪽 봉우리 봉화대 쌓은 곳으로 올라갔다.
쌓은 곳이 매우 좋아 전혀 무너질 리가 없었다. 이봉수가 부지런히 일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봉수대는 여수 돌산도의 방답진 봉수대와 종고산 북봉 봉수대가 있었다.
(노시훈·변동명·송은일 지음, 충무공 이순신과 거북선 그리고 여수, 심미안, 2010, p 12)
2월 8일
동헌 뜰에 석주화대(수군들이 야간 훈련을 위해 설치한 석인)를 세웠다.
2월 15일
석공들이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에 석수장이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3월 25일
새로 쌓은 성을 돌아가며 살펴보니 남쪽이 아홉 발씩이나 허물어져 있었다.
4월 19일
아침에 방비할 곳에 해자 파는 일로 군관을 정해 보냈다. 나도 일찍 아침을 먹은 후에 동문 뒤로 나가서 방비할 곳의 일을 직접 감독하였다.
나. 바다에 철쇄(鐵鎖) 설치
전라좌수사를 지낸 이량이 돌산도와 장군도 사이에 돌로 수중성을 쌓아 왜구를 막아내려 했던 것처럼, 이순신은 전라좌수영 부두의 동쪽 소포(여수시 종화동 종포)와 돌산도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철쇄(쇠사슬)을 1592년 3월 말에 설치했다. 이러한 철쇄 설치는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6일에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과 싸워 이긴 명량해전 때 철쇄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주2)
‘난중일기’에는 철쇄 설치 관련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1월 11일
이봉수가 선생원(先生院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갔다 오더니 벌써 큰 돌 열일곱 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보고 하였다.
1월 17일
저녁에 쇠사슬을 박을, 구멍 뚫린 돌을 실어오는데 배 네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군관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2월 2일
쇠사슬을 건너 매는데 쓸 크고 작은 돌 80여개를 실어왔다.
2월 9일
쇠사슬을 꿸 긴 나무를 베어오도록 이원룡에게 군사를 인솔시켜 새벽에 두산도(여수시 돌산도)로 보냈다.
3월 27일
아침을 일찍 먹은 후 배를 타고 소포(여수시 종화동 종포)에 갔다. 철쇄를 건너매는 것을 감독했고, 하루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해 보았다.
당시에 이순신의 군관 나대용이 전라좌수영 선소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있었다. 이 거북선이 소포에서 대포 사격 시험을 한 것이다. 거북선 돌격장은 순천사람인 급제 이기남이었다.
한편 4월 12일에 이순신은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 사격을 하였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의 군관 남한도 거북선 사격을 지켜 보았다.
하루 뒤인 4월 13일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왜군 18,700명이 부산포를 침략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주1) 편전(片箭)은 일반 화살인 장전(長箭)에 비해 길이가 매우 짧은 화살을 뜻한다. 우리말로 애기살, 부르며, 번역해 동전(童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편전은 외적이 대응하기 힘든 화살이었다.
1555년에 왜구들이 전라도에 침입했을 때 전라도 방어사(全羅道防禦使) 김경석이 군관(軍官) 남정(南井)을 보내 장계(狀啓)를 가지고 올라왔으므로 명종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였다.
남정은 명종에게 “영암 전투에서 우리 군사가 장전(長箭)을 쏘자 칼로 받아쳐 맞추지 못하게하다가 편전(片箭)을 쏘자 왜인들이 모두 두려워했다”고 보고했다. (명종실록 1555년 5월 30일 1번째 기사)
주2) 세키코세이는 1892년에 쓴 ‘조선 이순신전’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순신은 명량도 입구의 석량에 철쇄를 횡단해 걸쳐두고 기다렸다.
간 마사카게(구루시마 미치후사, 난중일기에는 마다시로 나온다.)의
선봉이 철쇄위를 통과할 때 철쇄를 끌어 당겨 배를 전복시켰다. 뒤를 따르던 배들은 앞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노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 배를 돌리지 못해 명량도 입구에서 일시에 전복되었다. 그 배의 수효는 헤아릴 수 조차 없었다. 이 틈을 타고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화포를 쏘아대는 한편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 수군은 크게 패하였으며, 간 마사카게는 전사하였다. 이순신의 군대는 크게 위용을 떨쳤다. (사토 데스타로 외 지음·김해경 옮김, 이순신 홀로 조선을 구하다, 가가날, 2019, p 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