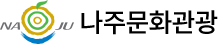(8) 명나라, 조선을 의심하다.
- 작성일
- 2022.07.22 09:31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00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8회 명나라, 조선을 의심하다.
김세곤 지음 (호남역사연구원장,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조선 조정, 왜국 동향을 명나라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다.
1591년 1월에 부산에 도착한 조선통신사 정사 황윤길은 급히 히데요시의 답서를 서울로 보냈다. 거기에는 “군사를 거느려 명나라를 뛰어 들어가겠다. 귀국이 향도가 되라”는 구절이 있었다. 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선통신사 수행원 50여 명을 통해 히데요시의 서신 내용이 알려지면서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다.
3월 중순에 전 현감 조헌이 일본의 서계(書契)가 패역스럽고 왜사(倭使)도 함께 나왔다는 말을 듣고서 옥천에서 백의(白衣)로 걸어와서 대궐 밖에 이르러 소를 올렸다. 그는 빨리 왜사를 베어 죽이고 급히 중국에 알릴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조헌이 대궐 밖에서 사흘이나 명을 기다려도 답이 내리지 않았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3월 1일 7번째 기사)
한편 3월에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일로부터 엇갈린 보고를 받고 나서 집권당인 동인 김성일의 의견에 동의하여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왜국의 정세를 명나라에 보고해야 하는 지 여부에 고민했다.
선조는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명나라에 알리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영의정 이산해는 명나라가 조선이 왜국과 사통(私通)하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니 숨기는게 낫다고 개진했다. 하지만 대사헌 윤두수는 명나라에 주문(奏聞)해야 한다고 하였다. 병조 판서 황정욱도 윤두수와 같은 의견이었다. 선조도 윤두수의 의견에 가까웠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4월 1일 2번째 기사)
이후 선조는 다시 의견을 들었다. 이때 좌의정 류성룡은 영의정 이산해와 약간 다른 이유에서 명나라에 대한 보고에 반대했다. 류성룡은 히데요시의 말은 명나라를 겁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히데요시의 일을 명나라에 보고하는 것은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임진왜란 2년 전쟁 12년 논쟁, 2021, p 46)
세 번째 논의는 5월 4일 미시(未時 오후 2시)에 창덕궁 선정전(宣政殿)에서 홍문관 부제학 김수가 《강목》〈동진원제기(東晉元帝記)〉를 진강한 후에 이루어졌다. 김수는 류성룡의 의중을 알고 명나라에 일본의 동향을 알리는 일에 적극 반대했다.
김수 :“히데요시는 정신 나간 일개 패악한 필부(匹夫)에 불과합니다. 그가 한 말은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실없는 말을 명나라에 아뢰는 것은 진실로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선조가 황정욱을 돌아보았다.
"병조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황정욱 : "부제학의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긴지 2백 년 동안 충근(忠勤)이 지극했습니다. 히데요시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 어찌 태연히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수 : “도리로 말하자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서계(書契)가 이처럼 황당하고 통신사 세 사신의 소견이 같지 않으니, 이것이 실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선조의 의견은 김수와 달랐다.
선조 : "설사 사신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침범할 리가 없다고 말하도 일본의 서계가 이와 같아도 당연히 알려야 할것이요. 태연히 있을 수는 없소."
김수는 굽히지 않았다.
"일에는 곧이곧대로 할 경우와 임시방편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침범하는 내용이 있다면 급히 진주(陳奏)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서둘러 상주(上奏)하였다가 공연한 소동이라도 난다면 후회막심하지 않겠습니까?"
황정욱이 반박했다.
"그 주장도 옳지 못합니다. 다행히 나라에 복이 있어 히데요시가 큰소리치고 마는 정도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서계(書契)에 적힌 대로 히데요시가 갑자기 중국을 쳐들어간다면 그때에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수는 지지 않았다.
김수 : " 중국의 복건(福建) 지방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해 있어 장사꾼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주(陳奏)한다면 왜국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주한 뒤에 왜국이 쳐들어 오지 않으면 중국에서 비웃을 것이고, 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깊은 원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 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는 김수와 생각이 달랐다.
선조 : "복건은 일본과 가깝고 장사꾼이 통행하고 있으니 일본이 우리에게 서계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미 중국에 전달했는지 어찌 알겠는가? 설사 히데요시가 침범하지 않더라도 서계에 그런 의도가 드러났으니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문책한다면, 왜적을 끌어들여 상국(上國)을 침범한다는 누명을 면할 수 있겠는가? 전일에 윤두수도 이런 점을 염려한 것이니, 주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김수는 한풀 꺾였다.
김수 : "주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더라도 일본의 군사 출동 시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조 : "섬 오랑캐의 실정에 대해 주문하는 이상, 군사 출동 시기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김수 : "분명치 못한 것을 언급함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내용도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국서를 주고 받은 사실을 그대로 알린다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자 선조가 좌승지 유근을 돌아보았다.
"승지의 의견은 어떠한가?"
유근 : "신이 일전에 내의원(內醫院)에서 좌의정 류성룡의 말을 들었습니다. 좌의정은 ‘대의로 보면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길이 광패(狂悖)하여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 우리가 왜적과 매우 가까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화를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다. 더구나 통신사로 갔다온 사신의 말을 들어보면, ‘왜적은 반드시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을 것이며, 출동시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다. 실상이 없는 말로 주문하면 한편으로는 중국을 경동(驚動)시키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웃 나라인 일본에 깊은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니 옳지 못하다. 일본과 국서를 주고 받은 일만 하더라도 곧바로 주문할 경우, 중국에서 따져 묻는다면 반드시 난처하게 될 것이다. 부득이하다면 일본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 온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말을 만들어 주문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조 : "내가 묻는 것은 승지의 의견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유근 : "신의 생각에는 대의로 보면 주문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하나 그대로 주문할 경우 난처한 일이 생길 듯싶습니다. 가볍게 주문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윽고 선조는 수찬 박동현을 돌아보고 말했다.
"경연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박동현 : "알려야 합니다. 다만 알리는 내용은 허술하게 할 수 없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하겠습니다."
선조는 박동현의 의견에 찬동했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5월 1일 1번째 기사)
5월 5일 아침에 선조는 3정승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영의정 이산해·좌의정 류성룡·우의정 이양원 등이 와서 아뢰었다.
“어제 경연에서 아뢴 말을 보건대, 김수가 우려한 것이 비록 일을 주도면밀하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왜국이 명나라를 친다는 말을 듣고 어찌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는 이미 명나라에 보낼 주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주문 가운데는 표현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후일에 난처한 일이 생길 대목도 있습니다. 유근의 ‘경미하게 대충 보고하자’는 주장은 자못 일리 있는 듯합니다. 전에 일본에 잡혀갔다 도망해 온 사람 김대기 등 30여 명에게서 들은 풍문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선조는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정은 명나라는 별도의 진주사는 보내지 않고 하절사 김응남이 명나라에 갈 때 대략 전해 들은 말이라고 하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주1)
# 명나라, 조선을 의심하다.
한편 비변사는 김응남이 떠날 적에 은밀히 경계시키기를 “요동에 이르러 소식을 탐문해 중국에서 전혀 알지 못할 경우 자문을 아예 제출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응남이 요동에 도착했을 때 ‘조선이 왜군을 인도하여 명나라를 침범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김응남 일행에 대한 대우도 예전과 전혀 달라 관원들은 쌀쌀하였다.
심지어 산해관(山海關)에 도착하자 관소(關所) 직원들이 “너희 나라가 왜놈들과 공모하여 반란을 꾀하고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느냐?”고 꾸짖었다.
당시에 복건성(福建省)에서 무역상을 하는 진신(陳申)이 유구(琉球 오키나와)에 들렀다가 “히데요시가 장차 쳐들어오려 하는데 조선을 선봉으로 삼았다.”는 말을 들었다. 진신은 귀국하여 복건성 순무(巡撫 지방장관) 조참로에게 알렸고 조참로는 조정에 보고했다.
유구국(琉球國) 세자 상녕(尙寧)도 사신을 중국에 보내 “일본의 관백이 조선으로 쳐들어가려 한다.”고 알렸다.
또한 강서성 출신 허의후는 포로가 되어 사쓰마 영주 시마스 요스히사의 의관(醫官)으로 일했는데, 히데요시가 장차 중국에 쳐들어갈 것을 알고 몰래 주균왕(米均旺)을 통해 절강성에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이 편지에는 조선이 1590년 5월부터 일본에 당나귀 등 조공을 바쳤고, 1591년 7월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속히 명나라를 치도록 재촉했다는 등 조선에 불리한 허위사실이 많았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5월 1일)
이처럼 진신과 허의후 등의 보고로 중국 조정은 떠들썩하였다.
다만 각로(閣老) 허국(許國)만이 지금 성절(聖節 황제의 생일)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 조선의 사신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성절사 김응남 등이 북경에 도착하자 허국은 김응남 등을 불러 자세히 물은 후 곧 조정에 알렸다. 이리하여 명나라의 의심이 차츰 풀렸다.
한편 1591년 8월에 요동 도사는 조선에 왜정을 보고하라고 했다.
“요동도사가 우리나라에 이자(移咨)하여 왜정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허의후가 무주(誣奏)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8월 1일 1번째 기사)
깜짝 놀란 선조는 10월 24일에 한응인을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보냈다.(선조실록 1591년 10월 24일)
한응인 등은 왜국의 동태를 알리고 조선이 허의후에게 무함 당한 사실을 변명하자, 황제는 조선 사신을 인견하고 극진히 위로하였다.
하지만 명나라의 조선에 대한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다. 명나라는 조선이 히데요시의 정명향도(征明嚮導)에 야합(野合)했으리라 의심하였고, 이런 의심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현실화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명나라는 즉각 지원병을 보내지 않았고, 의주에 있는 선조의 요동 망명에 대하여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김영진, 임진왜란 2년 전쟁 12년 논쟁, 2021, p 43-57)
주 1) 박동량은 ‘기재사초’에서 “윤두수ㆍ황정욱 등은 명나라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류성룡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선조 역시 명나라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했으나, 류성룡 등이 조정 공론을 잡고 있던 때라 일본의 침략 야욕과 통신사의 내왕한 곡절은 빠뜨리고 보고하지 말자”고 적었다.
그런데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은‘기재사초’와 다르다.
영의정 이산해가 반대했지만 자신이 명나라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여, 김응남을 시켜 명나라에 알리게 했다는 것이다. (유성룡 지음·이민수 옮김, 징비록, 2014, p 33-35)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때 윤두수는 당연히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류성룡은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강(朝講)에서 서로 논쟁 하였으나 결정짓지 못하고 낮이 되어 자리를 파했다. 그런데 류성룡은 ‘징비록’에 왜국 실정을 중국에 알리는 일을 기록하면서 ‘조정 공론은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 자기가 홀로 알리자고 아뢰었다’ 하였다.
윤근수(윤두수의 동생)가 일찍이 말하기를, ‘서애(西厓 류성룡의 호)가 임진년 일을 기록한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모든 잘된 일은 다 자기에게 돌려 앗아갔다.’하였다.”(제15권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임금의 행차가 서도(西道)로 파천 가다.)